평균 개발기간 15년→7년 줄일 수 있어 국내 제약사 30여곳서 AI 기업 협업·자체 개발 두 전문영역 이질성 극복 여부가 관건
R&D 역량은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은 국내 기업들이 넘기 힘든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AI 기술은 후보물질 설계부터 시작해 유전체 등 생체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임상과 임상시험을 설계하고 최적 환자군을 도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 불확실성과 시간, 비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센터는 AI기술이 신약개발 전 단계에 활용될 경우 신약개발주기를 15년에서 7년으로 단축시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AI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다. JW중외제약은 지난해 11월 AI 기반 신약개발 회사인 신테카바이오와 협력을 맺고 질병 원인 단백질을 대상으로 하는 신약후보물질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회사는 신테카바이오의 합성신약 후보물질 발굴 AI 플랫폼 '딥매처'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AI 신약개발 벤처기업 온코크로스와 AI 기반의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온코크로스의 AI 플랫폼인 '랩터(RAPTOR) AI'를 활용해 JW중외제약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의 신규 적응증을 탐색하고 개발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랩터(RAPTOR) AI'는 신약후보물질이나 기존 개발된 약물에 대한 최적의 적응증을 스크리닝하는 R&D 플랫폼으로 임상 성공 확률을 높여주고 개발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이성열 JW중외제약 대표이사는 "온코크로스의 AI 기반 기술을 활용한 공동연구로 새로운 적응증의 환자 맞춤형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확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유수의 연구기관, 기업들과 다각적인 연구협력 방식을 펼치면서 R&D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화약품도 유망 파이프라인을 확보를 위해 지난 1월 온코크로스와 협력을 맺고 AI 기반 항암제 신규 적응증 발굴을 도모했다. 최근에는 AI 기반 신약개발 벤처 심플렉스와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심플렉스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 플랫폼인 'CEEK-CURE'를 활용해 면역질환 치료제 유효물질 탐색 및 최적화를 통한 최적의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동화약품은 유효물질 및 후보물질의 합성과 검증을 진행한다.
동화약품 황연하 연구소장은 "우수한 후보물질을 효율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AI 신약개발은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 기술뿐만 아니라 의약화학 전문성까지 보유한 심플렉스와의 공동연구개발이 동화약품의 R&D 분야 경쟁력을 더욱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2020년 AI 기반 신약개발 전문기업인 스탠다임과 계약을 맺고 공동연구에 나섰다. 스탠다임은 인공지능 기반 선도 물질 최적화(AI-based lead optimization) 플랫폼인 '스탠다임 베스트' 등 자체 개발 AI 기술을 바탕으로 항암, 비알콜성지방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SK케미칼의 경우 실제 AI 기술로 짧은 기간 안에 신규 치료제 후보물질을 도출해 내는 성과를 보였다. 지난 2020년 11월 닥터노아바이오텍(이하 닥터노아)과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하고 AI플랫폼인 아크(ARK) 등을 활용해 후보물질 발굴에 돌입했다. 이후 1년 2개월만에 비알콜성지방간염과 특발성폐섬유화증 치료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닥터노아의 AI플랫폼 '아크'는 ▲문헌 정보 ▲유전체 정보 ▲구조 정보 등을 통합 분석해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술이다. 지난해에는 스탠다임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물질에 대한 특허출원을 진행하기도 했다. 현재는 심플렉스, 디어젠 등 다른 파트너사들과의 연구를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AI 신약개발 시장 협업은 미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시적인 연구 성과를 보인 사례가 매우 드물고 본격적인 활용 단계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신약개발과 AI 분야라는 두 전문영역의 이질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우연 AI신약개발지원센터장은 지난 달 30일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제약기업과 신약개발 AI기업은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로 협력하지 않고는 혁신을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 두 전문영역의 이질성을 극복하려면 AI 기업은 신약개발을, 제약사들은 AI 기술을 잘 이해해야 하지만 단번에 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솔루션, 플랫폼 등으로 불리는 AI 신약개발 모델은 실제 실험에 적용해봐야 정확한 성능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제약기업은 AI솔루션이 자신들이 원하는 기술과 성능을 갖추었는지 미리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반대로 AI기업은 자신들이 개발한 AI솔루션의 가치를 미리 입증하기가 어려워 AI기술과 신약개발 수요가 잘못 매칭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의욕적으로 시작한 공동연구가 서로에게 실망만을 안기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는 게 김 센터장의 설명이다.
김 센터장은 "신약개발은 단계가 매우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신약개발의 고질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발전이 더딘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만큼 많은 투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약개발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것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며 "전 세계에 대략 300개의 AI 신약개발 스타트업 있고 빅파마들과 협업해 실제 임상까지 진행한 사례는 3개 정도다. 기술이 부족해서 라기 보다는 신약개발이 복잡하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충분히 기술을 성숙시키고 적용하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고, 다양한 전문인력도 배출되고 있다. 서로 협업해 기술개발이 촉진되면 멀지 않은 시간에 국내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유수인 기자
sui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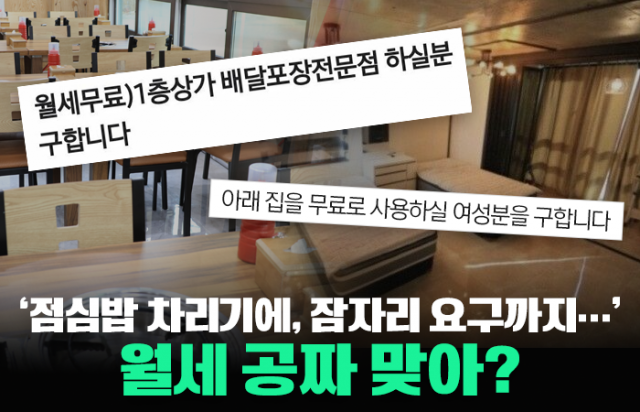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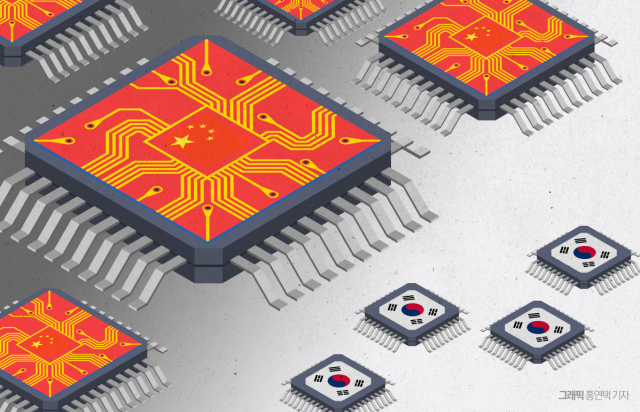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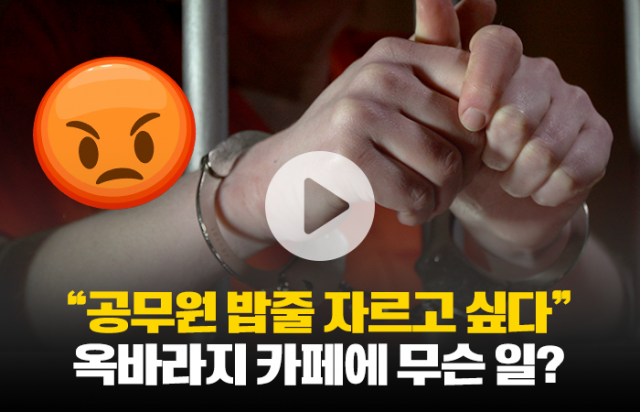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