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제도시행 목적과 달라···현 시대 필요성·실효성 의문IT업계 대기업 지정 늘어···'한국식 규제'에 글로벌 성장 저해
또 동일인(총수) 기준으로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현황과 계열사 주주 현황 등 지정 자료를 제출받는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제한을 두는 것도 이 제도에 근거한다.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 일가가 사익 편취를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각에선 이 같은 제도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다른 한쪽에선 대기업 내부 거래 감시에 더욱 열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공정위는 대기업들의 일명'일감 몰아주기'와 '기업 지배구조' 파헤치기에 집중하고 있다.
기업들 역시 대기업 지정 시즌만 되면 날이 곤두서는 분위기다. 해마다 공정위의 규제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물론, 신규 지정되는 기업들의 경우 본격적인 '규제의 틀'에 갇히는 꼴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대기업 지정 제도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인 1980년대는 경제 개방도가 낮아 일부 기업의 국내 시장 독점이 가능했지만 현재와 같은 개방 경제에서는 시장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동일인 지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총책임자 격인 '총수'를 지정하는 제도가 '동일인 지정제도'다. 이는 재벌 일가의 족벌 중심 경영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재벌 일가가 아니라 스타트업으로 출범해 외국 자본 등의 투자를 받은 쿠팡, 네이버 등에 동일인 지정제도를 적용하기엔 무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제도를 관리·감독하는 '기업집단국'을 두고도 시대에 역행하는 조직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기업집단국은 한시적인 조직에서 지난해 '정규 조직'으로 재탄생했다.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을 규제하는 조직을 상설화해 기업들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정부의 기업 규제가 되레 과거로 후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현대차·SK·LG 등의 기업 투명성은 이미 높아졌고,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재계 40위 안에 진입한 카카오·네이버·넥슨·넷마블 등 IT, 게임 기업들은 이미 투명한 지배구조와 수평적 의사결정 체계로 출발했다.
과거와 달라진 경영 방식에도 공정위가 '한국식 규제'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내가 규정하는 자산 '5조 원 이상=대기업' 식의 공식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에서는 '포천' 또는 '포브스' 같은 경제잡지가 순위를 발표하는 게 전부다.
익명의 재계 관계자는 "자산 기준으로 대기업 순위를 정하고 각종 규제 잣대를 들이대면 기업들은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는 수용하지만 무조건적인 규제로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가 현시대에 필요한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bse100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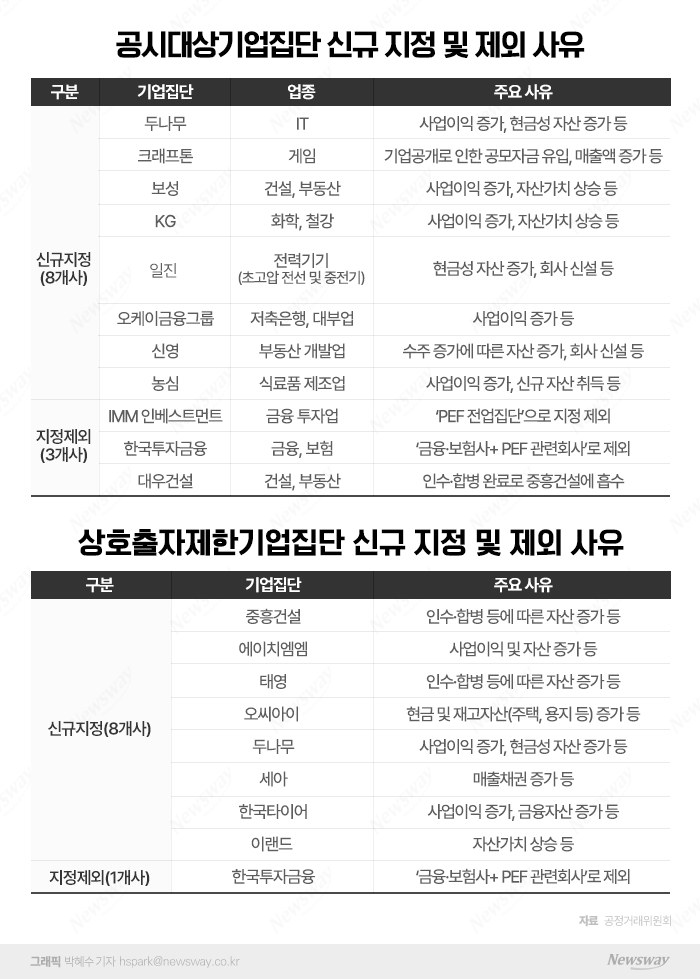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