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알펜루트 사태 등 펀드사고 ‘소용돌이’ 피해옵티머스 사태도 피해가, 직접 확인했다는 증언이다른데선 “직접 확인 의무없다”고 변명하기 일쑤‘까다로운’ 선정에 ‘철저한’ 사후관리가 빛 발해배당사고가 전화위복 계기, 리스크 관리 강화장석훈 사장의 ‘원칙주의’가 한몫했다는 평가도
라임과 알펜루트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 등을 피하자 이미 ‘투자 안전지대’로 재평가 받았던 삼성증권. 최근 이슈 되고 있는 옵티머스 사태도 피했다는 말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삼성증권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다시 한 번 더 빛을 발하고 있다. 잇따른 펀드 환매 중단 사고로 대형 증권사들이 곤욕을 치르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세간의 말에 따르면 삼성증권도 애당초 다른 증권사들처럼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 운용하고 있는 펀드와 판매 계약을 맺으려고 했었다는 것이다. 옵티머스운용 펀드가 엄청난 수익률을 가져다주지는 않지만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이라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발생시킨다는 점이 매력이었고, 또 관련 펀드는 옵티머스에서만 발행한다는 소식이 금투업계에 널리 전해지면서 대형증권사들 사이에서도 입소문 난 펀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삼성증권은 옵티머스가 단독으로 판매하는 펀드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여다봤고, 확인 결과, 해당 공공채권에서는 관련 매출채권을 발행한 일이 결코 없었다는 것이다. 이상한 점을 감지한 삼성증권이 당시 대형증권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던 옵티머스 펀드 판매에 손도 대지 않았고, 이렇듯 이중·삼중으로 직접 확인하는 등 철저한 검증 덕분에 삼성증권은 이번 옵티머스 사태 역시 피해갈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 얘기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에게도 불통이 튀었다. 사태가 터졌을 당시 판매 증권사에게도 책임론이 나오자 “판매사가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하라는 것은 운용까지 책임지라는 것”, “현행법상 확인불가”라며 반박에 나섰다. 하지만 판매사에서 사전에 공공기관이나 도급회사에 ‘단 한 통의’ 확인 전화라도 했다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았다. 그러나 삼성증권에 확인한 결과 “옵티머스 펀드는 애당초 검토조차 하지 않았고, 세간에 떠도는 소문은 다른 증권사 얘기인 것으로 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삼성증권을 둘러싼 옵티머스 얘기는 왜 나왔을까. 그나마 상대적으로 펀드 사고가 덜한 삼성증권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 리스크 관리는 보수적인 상품 선정 문화와 철저한 판매 시스템, 사후관리 서비스로 펀드사고 풍파 속에서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중·삼중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먼저 새로운 형태의 상품을 제안 받은 경우 상품팀을 비롯해 리스크관리팀, 금융소비자보호팀, 마케팅팀 등 상품 관련 팀 실무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1차 심사를 진행한다. 여기서 통과된 상품은 임원들과 주무팀장들로 구성된 상품위원회로 전달돼 다시 심사를 받는다. 그럼에도 리스크 담당자가 반대하는 상품은 사실상 가판대에 오르기 힘들 정도로 상품 선정에 있어 리스크 평가를 중요시 여긴다.
리스크 관리를 통해 펀드 사고 풍파에서 빗겨나갈 수 있게 되자, 일각에서는 2년 전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배당사고)’ 이미지도 거의 개선됐다고 말한다. 오히려 배당사고가 전화위복 계기됐다고도 말한다. 이 사건을 통해 삼성증권은 리스크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 ‘원칙’을 매우 중요시하는 장석훈 대표의 리더쉽 덕분이라고도 말한다. 업계 안팎에서도 장 대표에 대해 오랜 기간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에서 인사와 재무를 맡아와 원칙을 중시한다는 평가가 많다.
장 대표는 삼성증권이 배당사고로 큰 위기를 맞았을 때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를 단속하면서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낸 인물이다.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도 앞장섰고, 소비자보호 관점의 사전검토 절차가 선행되도록 소비자 보호 프로세스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삼성증권은 지난해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금융상품매매와 위탁매매 등 2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서서히 고객 신뢰를 회복해 나갔다.
관련기사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yoon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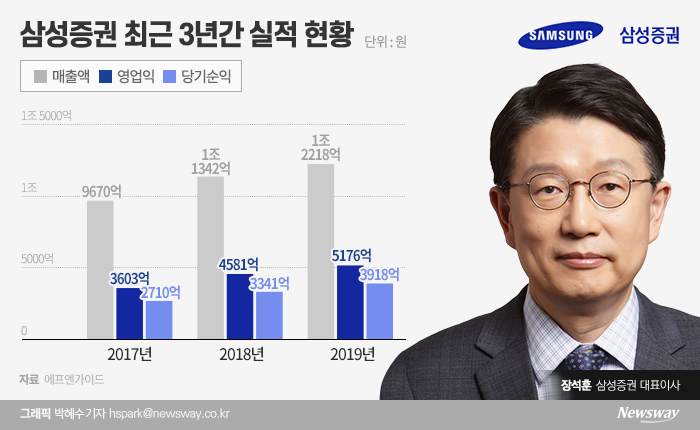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