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S/W직군'과 '자회사' 엔지니어의 임금은 노사관계 바깥에 있다. 애초 많은 인력이 '네카라쿠배'라고 불리는 국내의 IT업계나, 실리콘밸리나 디트로이트 등의 해외에서 근무하다 '이직'해서 왔기 때문이다. 특히 자율주행, 차량 구독 서비스 같이 '미래 먹거리'로 생각되는 분야의 엔지니어들은 '부르는 게 값'이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다루는 매체들은 개발자를 포함한 엔지니어들의 수억대 연봉과 스톡옵션 제공이 경영상에 큰 위협이 될 정도라고 말한다. 그런 엔지니어들을 영입하는 일이다. 인터뷰를 해보니, 실리콘밸리나 국내 IT업체 연봉을 맞춰주려고 다른 직군으로 따로 편성하거나, 자회사를 통해 채용해 임금단체협상의 '커버리지'와 상관없이 하려는 방향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왕년에 가장 높은 임금을 주던 탑 티어 기업 중 하나인 현대자동차는 실적에 문제가 있었던 몇 년간 성과급이 많이 나오지 않아, 별로 높지 않은 임금을 주는 회사 취급을 받게 되었다.
중공업과 이른바 '기름집', 석유화학산업이 연봉이 높고 안정적이라며 공과대학 나온 구직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시절이 있었다.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거기에 참여했다가 기업이 매각될 때나, 회사가 잘 되어 상장 될 때 스톡옵션으로 받았던 주식의 가치가 급상승하여 '대박'을 칠 거라는 기대를 하던 엔지니어들은 일군의 집단을 이뤘을 뿐 전반적으로 보면 산업계에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IT산업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도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이라는 숙제 때문에 '해커'들을 영입하려는 상황이다. 또한 테슬라처럼 'IT회사 같은 제조업 회사' 혹은 '제조업 회사의 외양을 갖춘 IT회사'들이 승승장구할 때마다 제조업 주변의 노동시장은 급속도로 재편될 것이다. 언제든 임금의 거품이야 빠질 수 있겠지만, 인재영입을 위한 경쟁자체가 사라질리 만무하다.
이 와중 제조기업들 관점에서 볼 때, 기술혁신을 위해 내부적으로 'S/W직군'의 엔지니어들과 기존 연구소의 엔지니어들을 경쟁시키거나 협업시키는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비슷한' 일을 하는 엔지니어들의 임금체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는 숙제가 따라온다. 젊은 연구소 엔지니어들의 불만은 그냥 'MZ세대'를 대하는 '40~50대 꼰대 관리자'의 태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직무급이냐 연공급이냐 성과급이냐 하는 임금체계의 질문부터, 역량과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는 인사관리 체계 정비까지 까다롭고 예민하되 풀리지 않은 숙제들을 던지는 셈이다. 물론 그렇다고 굴지의 제조대기업들이 과정이 거칠지는 몰라도, 문제를 풀지 못하리란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외려 이 상황에 걱정이 되는 것은, 제조업 밸류 체인의 하단부에 위치한 소부장 업체들의 인력난이다. 스마트 팩토리 등 인프라야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를 받아 설치하더라도, 그걸 운영할 우수한 인력을 '적정한 연봉'을 주고 영입하기 힘든 기업들에게 '탑 티어 엔지니어'의 몸값은 남의 일이다. 게다가 사업장이 지방에 있다면? 악조건에 악조건을 더한 셈이 된다. 이런 문제는 누가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 최소한 단순히 최저임금을 맞추는 수준의 논의를 넘어서야 한다. 제조업의 전환을 위한 생태계 관점에서 이해당사자들의 효과적인 논의를 기대해 본다.
관련태그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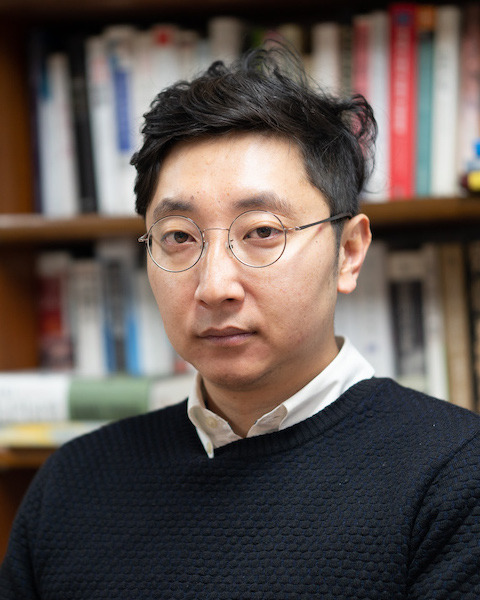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