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위해라면 내 기업, 남에게 줄 수 있다”자발적 빅딜로 ‘관치 빅딜’시대 막내린다선제적 대응···생존력·경영효율성 높여
최근 재계에서 언급되고 있는 ‘셀프 빅딜’의 핵심에는 부동의 재계 순위 1위 삼성그룹이 있다. 삼성은 두 차례에 걸친 ‘셀프 빅딜’을 통해 5개에 달하던 화학 업종 계열사의 경영에서 모두 손을 뗐다.
삼성은 지난해 11월 한화그룹과의 빅딜을 통해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삼성탈레스, 삼성테크윈 등 화학·방위산업 계열사를 정리했다. 이어 지난 10월 30일에는 롯데그룹과의 2차 빅딜로 삼성SDI 케미칼부문, 삼성정밀화학, 삼성BP화학 등 잔여 화학 계열사를 넘겼다.
삼성발 2차 빅딜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 다른 빅딜이 성사됐다. SK텔레콤이 지난 2일 케이블TV업계 1위를 고수하던 CJ헬로비전을 전격적으로 인수한 것이다. 이후 SK와 CJ는 콘텐츠 창작과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공동 투자하겠다는 의견까지 내놨다.
이외에 다수의 기업들은 그룹 내부에 산재돼있던 사업 부문을 조정하는 등 자발적인 교통정리에 나서고 있다.
LG그룹은 LG화학의 OLED사업을 LG디스플레이로 이관시키며 OLED 기술력 배가에 나섰고 하이로지스틱스를 범한판토스에 넘기면서 물류 사업을 일원화시켰다. 더불어 지난 7월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를 서로 합쳐 수직계열화를 완성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나 금융권이 관여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모두 민간기업 스스로가 의견을 결정했고 각 기업 관계자들끼리 거래를 마무리했다. ‘관치’가 판을 치던 과거와 비교해보면 상전벽해(桑田碧海)가 아닐 수 없다.
◇사업 이해관계의 기막힌 부합 = 재계 다수의 기업이 초대형 거래를 스스로 성사시킨 배경으로는 상호 간에 적절히 맞아 떨어진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삼성은 전자업과 금융업을 주력 업종으로 두고 바이오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고 있다. 주력 업종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브랜드 파워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 산업만큼은 다른 업종에 비해 돋보이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삼성의 사업구조 재편 초기 당시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이 화학 업종을 비롯한 비주력 사업군을 과감히 포기할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다.
삼성의 거래 상대였던 한화와 롯데는 화학 산업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 두 기업은 화학업계에서 꽤 잘 나가는 축의 회사로 분류됐고 장기적 성장을 꾀하기 위해서도 화학업에 대한 적극적 육성이 필요했다. 여건이 상충되는 이들끼리 만났기에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SK와 CJ의 빅딜 전 여건도 삼성과 한화·롯데의 상황과 비슷했다. SK는 반도체와 통신 인프라를 아우르는 ICT 사업 분야에서 더 나은 실적을 내길 기대했다.
반대로 CJ는 미래 잠재력이 뛰어난 문화 콘텐츠 생산에 승부를 걸고자 했다. 케이블TV 사업의 실적이 좋기는 하지만 항구적 성장을 꾀하기에는 현실적 장벽이 있었다.
SK는 사업을 키우고 싶어 했고 CJ는 이익을 내던 사업임에도 장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업에 욕심이 있었다. 이같은 상호의 필요조건이 서로 부합하면서 거래가 성사된 셈이다.
◇유연해진 오너 관계도 한몫 = 무엇보다 최근의 빅딜이 눈길을 끄는 것은 기업 오너들끼리 직접 빅딜 의견을 교환하고 직접 승낙했다는 점에 있다. 과거에는 정부가 각 기업 오너들을 졸라서 답을 이끌어냈지만 이제는 모든 과정을 기업 스스로 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과 롯데의 빅딜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직접 만나 빅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격적인 빅딜이 기업 스스로 이뤄진 것은 과거보다 훨씬 유연해진 오너 간의 관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재계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들은 재계 2·3세대다. 공적인 일이 됐건 사적인 일이 됐건 오래 전부터 재계 안팎의 여러 곳에서 얼굴을 마주하는 인연을 갖고 있다. 일부는 학교 동문의 관계로 만나기도 한다.
무엇보다 현재 경영권을 쥐고 있는 이들은 과거 재계 1세대 인사들에 비해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는 신세대 재계 리더들이다.
특히 과거의 경우 “내 회사를 어떻게 남에게 그대로 내주느냐”며 사업 교환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던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회사가 잘 된다면 사업을 맞바꾸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트렌드가 바뀌었다.
◇현장 직원의 마음 헤아려야 = ‘셀프 빅딜’은 기업 스스로의 생존 기반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항구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젯거리는 있다. 해당 기업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소속감과 생계 문제다.
실제로 삼성에서 한화로 간판이 바뀐 한화종합화학을 비롯해 일부 기업에서는 매각 이전부터 홍역을 치른 곳이 많다. 대부분은 합병 이전과 이후의 달라진 처우 등의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재계 관계자는 기업의 효율성 문제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느낄 상대적 허무감이나 실질적인 박탈감 등을 먼저 감안해 그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내놓는 것이 ‘셀프 빅딜’을 무난히 마무리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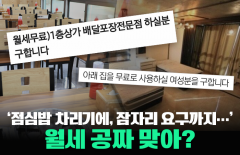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