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감원에서 분리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금융소비자보호원’, ‘금융소비자기획단’, ‘금융소비자보호법’의 3종 세트로 구축할 계획이다
금소원장도 금감원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금소원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권과 제재권을 갖게 돼 사실상 금감원과 대등한 위상을 갖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수익을 내서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감독하는 역할만 맡게 되며, 금융회사의 횡포로부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업무는 금소원이 전담하게 된다.
금융시장은 늘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곳이다. 정보력에서 우위에 있는 공급자는 시장에서 늘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교섭력을 따로 갖추지 못한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적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키코(KIKO), 저축은행사태, CD금리 담합사건 등에 있어서 개별적이고, 상대적으로 약한 금융소비자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일례로 키코 사태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 급등으로 수백여 중소기업이 3조원대 손실을 입고 파산, 법정관리가 속출했다. 5년이 지난 현재도 총 300여건에 가까운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10년 터진 저축은행 사태는 금융소비자 보호원 설치를 촉발시킨 핵심 사태라 할 수 있다. 당시 금융감독 당국은 감독은커녕 이권을 챙기면서 부실을 눈감아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 소비자 보호는 한 기구가 모두 보유해서는 안 되는 권한이다. 이해가 상충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 감독 기구 퇴직자들이 금융회사 임원으로 채용돼 금융회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진 지 오래다.
금소원이 독립기구가 됐지만 금융위원회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문제가 남아있다. 금소원이 독립해도 금융위가 금융 감독 기구를 관할하는 현행 체제로는 금소원이 기대만큼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가 내놓은 금융감독 체계 선진화 방안에 대한 외부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 대해 금융소비자단체들은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금융사들은 상전만 더 늘까봐 걱정이 태산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널뛰듯 변하는 금융감독체제에 대한 불만도 무시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금융위 체제로 바꾼 지 5년 만에 또 다시 감독시스템 개편 문제가 거론되니 업계로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금융위가 이달 안에 금소원 설치를 담은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금융감독 체제에 명확한 정답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구의 설치나 조직개편보다 금융위기 예방, 건전한 시장규율 확립,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 등을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 여부다.
서영백 자본시장부국장 young@

뉴스웨이 서영백 기자
young@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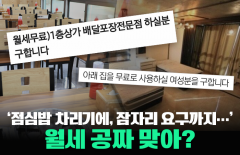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