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117년 만에 가장 뜨거운 7월 초 기록
서울 등지 40도 이상 폭염, 온열질환자 1000명 돌파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현실
5월 이후 온열질환자 1000명 이상 발생
사망자 9명 기록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 억제 목표 불안 고조
폭염 피해, 계층별로 불평등하게 작동
화이트칼라와 노동직, 취약계층 간 격차 심화
기후위기 대응, 단기적 대책에 머물러 있음
AI와 디지털 전환, 에너지 소비 증가와 탄소 배출 동반
AI 저전력화와 에너지 관리 효율성 동시 고려 필요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쌍둥이 전환 과업으로 통합 필요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이 모든 인구에게 공평하지 않고 차별적 방식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견해도 더욱 힘을 얻는다. 당장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화이트칼라 직군과 고온다습한 기후의 영향을 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택배기사나 조선소 용접노동자의 환경이 만들어 내는 격차가 분명히 존재한다. 주거 관점에서도 여전히 선풍기로 버텨내고 있는 취약계층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폭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비를 하는 단기적 과업 말고, 앞으로 다가올 기후위기에 대한 예방적 조치는 여전히 미진해 보인다. 발전에 활용되는 에너지의 전환, 그리고 RE100등 산업에서의 탄소배출 제어 등 생산 영역에 대해서는 일련의 합의가 있지만, 소비 방식을 어떻게 탈탄소 전환할 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쓰레기 분리수거 같이 개별 가구의 노력을 독려하는 수준 이상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나온 책인 <모든 것을 전기화하라>는 아이디어를 받아, 생활의 에너지원을 전기로 충당하는 방식은 유효한데, 이를 위해 개별 가구의 에너지 소비 방식에 대한 메뉴얼은 아직 정책 관점에서 불비해 보인다. 게다가 전력을 잡아먹는 새로운 방식인 LLM 등 AI 활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중인데, 이에 대한 대비로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고속도로를 언급하지만 인프라로만 될 수 있는 일일까? AI의 저전력 소비를 위한 로드맵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AI를 활용한 에너지 관리의 효율성 못지 않게, AI를 활용할 때 사용되는 전력과 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발생되는 탄소 배출에 대해서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거시적으로 보자면, 기후위기를 억제하고 산업전환을 한다는 것이 디지털 혹은 AI 전환(DX 또는 AX)와 녹색 전환 혹은 탈탄소 전환(GX)의 문제를 병렬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닌 한 몸체로 전환하는 '쌍둥이 전환'의 과업이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지만, 이는 AI미래기획수석이 담당하는 분야와 함께 사고해야 한다는 말이다.
근 2년간 AI가 우리에게 체험되는 속도가 가속페달을 밟아왔다면, 2025년은 기후위기 체험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미래' 이야기가 아니다. '열섬 지구'(hot-house earth)를 막기 위해 당장 성층권에 에어로졸을 살포해 지표면에 도달하는 햇빛의 양을 줄이는, 아직 결과와 부작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위험천만한 지구공학적 기법마저 검토되는 상황이다. 새로운 정부가 '현재'적 관점에서부터 '미래'까지의 '기획'을 넘어선 '실행계획'을 기대한다.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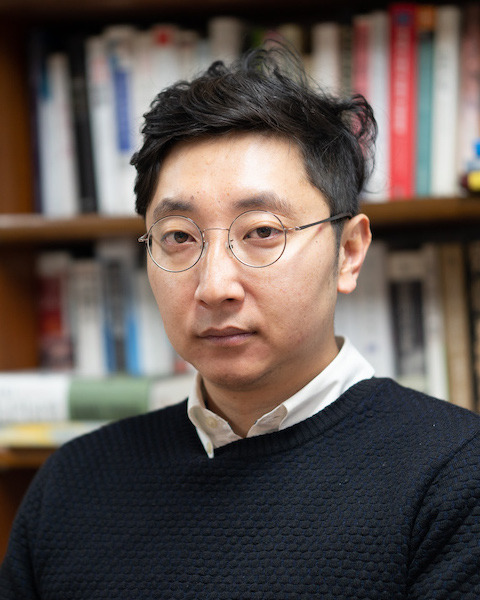



댓글